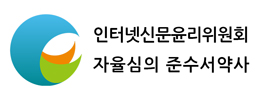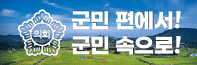박상사이소, 오꼬시 사이소
권영심
명절이 다가오면 상인들의 대목맞이도 분주했지만, 못지않게 바쁜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들의 주전부리인 불량식품을 비롯해서 쪽자장사며 박상장사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요즘 오징어게임으로 유명해진 또뽑기와는 다른 쪽자가 있었는 데 연탄불에 국자를 올려 놓고 설탕이나 각종 덩어리를 녹여서 소다를 조금 넣어 부풀려서 먹는 과자이다. 하얀 덩어리를 국자 에 넣어 잘 녹인 후 소다를 넣으면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데, 건드리지 말고 판에 살그머니 엎어 굳히는 것이 관건이다.
소다 양과 넣는 시점에 따라서 쪼그라들거나 깨지거나 해서 나름 노하우가 필요했다. 노란 설탕도 녹였고 젤리같은 것도 녹여서 만들었는데, 연탄불 주위로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곤 했다.
남동생은 성격이 급하고 성말라서 집에서 해먹느라 멀쩡한 국자 를 못 쓰게 만들기도 했었다. 나는 쪽자는 해본 적이 없으나 박상과 오꼬시를 좋아했다. 추석에 먹는 과자로 박상이 최고 였다. 여름엔 더워서 진득거려 아무도 손대지 않았기에 박상 아저씨가 나타나는 것은 추석 즈음부터 이듬해 봄까지였다.
박상아저씨는 시장이 복잡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고오는 짐의 부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었다. 지게에 지고 다녔는데 사람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과자짐의 부피가 컸다. 무게가 거의 없는 과자였으나, 지금 생각하니 몇 십키로는 되었지 싶다. 종류가 정말 많았으니까.
가게 앞에 지게를 내리고, 아버지가 내준 의자에 앉으면 어깨로 숨을 내쉬었으니 많이 힘들었음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다. 엄마는 커다란 대접에 설탕을 몇 숟가락 퍼 담고 큰 주전자에서 끓고 있는 보리차를 부어 내주었다.
추석 전후엔 시원한 것을,겨울엔 뜨거운 것을 얼마나 맛있게 마시는지 보는 사람이 침을 삼킬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두어끼는 그냥 굶고 장사를 다녔을 것이니 달콤하고 따뜻한 보리차가 얼마나 맛있었을까?
박상아저씨는 물을 다 마시고 나서야 포대를 열었다. 지금 생각 해도 종류가 열 댓가지는 넘었고 오꼬시는 석작에 따로 넣어져 있었다. 박상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부산을 떠나서 딴 곳에 서는 못 보았는데, 월남 과자라고도 했다.
넓적한 모양에서 꽈배기형, 세모로 꼬은 모양,긴 막대기 모양, 동그란 공 모양, 등등...밀가루로 만들어 튀긴 과자였는데 모양 도, 맛도 다 달랐다. 모양만 달랐으면 그렇게 여러 종류를 살 일이 없었다.
어디서 기원되었는지 아무도 몰랐으나, 월남에서 돌아온 상이 용사들이 생계 수단으로, 그 곳에서 먹은 과자를 흉내내어 만든 것이라는 것이 가장 정설이어서 박상, 아니면 월남과자라고 불렀다. 지금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옛날과자들과는 많이 다르고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잊을만 하면 와서 팔았는데 우리집의 요긴한 간식꺼리였다 . 나는 오꼬시를 좋아해서, 아버지는 내 몫으로 항상 한 봉지씩 따로 사 주었고 나는 방에 감추어두고 잘 먹었다. 우리 가게 앞에 지게를 부려 놓으면,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갔는데 저마다 바가지며 소쿠리를 들고 왔다.
박상아저씨는 명절 전 단대목부터 매일 시장에 나타나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때가 대목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놀다가도 박상 아저씨가 나타나면 누구든지 과자를 한 꾸러미씩 사서 집으로 가져갔다. 가격이 싸고 푸짐해서 간식꺼리로는 그만이었다.
"박상 사이소 !오꼬시 사이소!"
박상아저씨의 걸직하고 울림이 좋은 목소리가 구성지게 울려 퍼지는 명절 오후는,지금 생각하니 오금이 저리는 듯한 행복 이었다. 한 짐 지고 온 과자를 다 팔고, 탁배기 한 잔 얻어 마시고 껄껄 웃으며 걸어가던 아저씨의 등 뒤에서 가벼운 지게가 덜렁덜렁 춤을 추었다.
그 날 밤 박상아저씨의 집에서도 고소한 전 굽는 냄새가 가득 퍼졌을 것이다. 때로는 기름 쩐내가 나기도 했으나 아무도 그것 을 뭐라 말하지 않았다. 그 시절에 그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늦은 장맛비에 조금 눅눅해졌어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 박상 특유의 맛과 고소함을, 지금 나는 표현할 말이 없다. 분명히 혀 끝과 기억엔 선명하건만 그 맛을 뭐라고 말하지 못 하겠다. 지금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다. 오꼬시만 해도 그렇다. 지금도 생과자니 화과자니 해서 먹을 수는 있으나 오꼬시만의 그 맛은 이미 없다.
입맛이 변했다고 말하겠지만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 . 오꼬시는 일본말임이 분명하지만 이 말은 어떤 단어로도 대체 불가능이다. 아버지가 사준 오꼬시 봉지 안에 든, 여러가지 과자는 다 맛이 다르고 향이 달랐다.
누런 봉지 안에서 하나씩 야금야금 꺼내 먹으면서 느꼈던 그 행복한 달콤함은 이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아버지는 남포동 과자집에서도 오꼬시를 사오곤 했는데, 박상아저씨의 그것과는 좀 다른 맛이었다 .
좀 더 고급진 맛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나는 다 좋았다. 특히 겉은 까끌한 눈사람 모양인데, 속은 팥앙금으로 가득 채워진 하얀 과자는 나의 최애 과자였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던 그 맛...팥의 향기와 함께 너무나 맛있 었고 행복했던 기억이 이렇게나 또렷하다. 어쩌나? 어쩌나...이젠 찾을 수도,먹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도 안타까운 느낌은 어쩌나...어찌하면 좋으니? 명절 연휴에 먹을 것이 지천인데도 나는 박상 한 조각이 그립다.